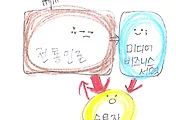|
대부 -  마리오 푸조 지음, 이은정 옮김/늘봄 |
요즘 해야 하는 일은 많은데 하기는 싫고 봄이나 타는 게 싱숭생숭해서, '화성에서 온 남자...'를 반납하는 차에 좀 가볍게 읽을 책을 찾았다. 책 많이 읽는다는 심남이에게 "저 지금 도서관왔는데, 가볍게 읽을 소설하나 추천해주세요" 보냈더니 한 세시간 뒤에 "문자를 지금 봤네요. 단편 소설 쪽으로 찾아보세요" 답문오길래 고맙습니다도 안하고 씹어버렸다. 문자에 'ㅋ'를 안붙여서 그런가? 제기랄.
아무튼, 나도 알고 너도 아는 그 유명한 대부를 고르면서, 이 두께로는 요즘 부는 돌풍에 이 무거운 몸 날아가지 않도록 붙잡아줄 누름돌이되겠지만 내용은 하루밤에 아이 재밌어 다 읽어 버릴 정도로 가볍겠구나 생각했다. 아니나 달라, 내일(앗! 오늘!)은 어린이날인데 금요일에 볼 사회조사분석실습 시험 공부나 안할 생각하며 읽을 만큼 괜찮았다. 물론, 00시경에 밖에서 '쿠당' 하는 소리와 함께 좆중딩으로 추측되는 1인 이상의 애새끼들이 내 스쿠터를 훔치려다 넘어뜨려서 후다닭 도망가는 사태가 일어나서 놀란 가슴 진정시키는 겸 해서 읽긴 했지만 그래도 재밌는 건 재밌는 것이다.
대부를 읽으면서 어려웠던 것은 단 하나, 사람들 이름이 익숙하지 않아서 몇 번이나 잠깐 멈춘 다음 이 사람이 뭐 했던 사람인가 생각해 봤던 것 뿐. 내용은 아주 그냥 술술 읽힌다. '누난 괜찮고요? 어쩌다가요?' 하고 스쿠터 대신 내 걱정해준 따뜻한 후배한테 '대부가 전국평화회담을 주최하고있음 9부까지있' 까지 써서 답장 보내려다가도 말고 읽었는데, 다 읽고 나니 또 싱숭생숭하다.
무엇을 보든지간에 너무 심하게 경도되지 않도록 잠깐잠깐 쉬며 텍스트를 꼬아보는 버릇이 있는 (포스트맨... 포스팅 때 댓글에서 변명도 했지만 난 아무래도 삐딱삐딱 열매를 먹었는가봐)지라 내용 중간중간 '흠, 대부를 무슨 대왕 성자처럼 그려놨군 그 사람도 결국 자기 이익을 위한 거잖아', '마피아에 대해서 너무 옹호해 기분 나쁜데' '개인적 카리스마에 의한 리더십은 결국 그 사람이 존재 할 때만 가능한 리더십이잖아' 등등으로 생각하면서 봤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읽으면서 나는 텍스트를 통해 설파하는 작가의 충실한 독자가 되어 대부와 그의 패밀리에 긍정적인 마음으로 기우는 내 자신을 느꼈다. 내가 이 책을 성인이 되어, 좀 머리가 큰 다음에 읽은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할 정도다. 사회와 법률은 그 창조자들을 착취하고 '진정한' 정의가 객관적 법이 아닌 주관적 초인에 의해서 실현되는 대부의 내용은 왠지 모르게 사람을 끄덕이게 만드는 힘이 있다. '그래도 사람을 죽이는 건 안돼'라고 마음을 돌이켜 보려고 해도 잘못된 법이 사람을 죽이고, 정의를 위해 만들어진 법을 법을 통해 우롱하는 이 현실을 보고 있으면 과연 무엇이 더 정의인가 하는 생각을 할 수 밖에 없다.
니노의 장례식 이틀 후 모 그린은 영화배우인 정부의 헐리우드 집에서 총에 맞아 죽었다. 앨버트 네리는 뉴욕에서 자취를 감추었다가 한 달 만에 나타났다. 카리브해에서 휴가를 즐긴 그는 새까맣게 타서 돌아왔다. 마이클 코를레오네는 미소로 그를 환영했다. 그리고 특별히 매출이 좋은 동부 지구의 도박장에서 들어오는 수입의 일부를 특별 보너스로 지급하게 될 거라는 소식을 전하며 몇 마디 찬사를 해주었다. 네리는 일한 만큼 대가가 돌아오는 세상에 살고 있는 자신이 자랑스러웠다.
제 7 부 p634
앨버트 네리가 직권남용 혐의로 문책을 받았을 때 놀란 사람은 그 자신뿐이었다. 그는 결국 정직 처분을 받았고 살인혐의로 기소당했다. 만약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1년에서 10년까지 꼼짝없이 징역살이를 할 게 뻔했다. 그 당시 그는 사회에 대한 분노와 증오를 억누를 수가 없었다. 한번도 저주하고 비난하지 않았던 사회가 감히 그를 범죄자로 판결한 것이다! '그런 짐승 같은 악당을 처치한 나를 감히 감옥으로 보내다니, 그렇다면 면도칼에 난자 당해 목숨이 위태로웠던, 그래서 지금도 병원에 있는 어린 소녀와 여자를 위해 사회는 무엇을 했단 말인가!' 그는 이런 생각을 하며 허탈해 했다.
제 8 부 p658
'일한 만큼 대가가 돌아오는 세상에 살고 있는 자신이 자랑스러웠다' 라는 부분에서 나는 질투를 느낄 뻔했다. 경찰관이었던 앨버트 네리는 직속 경사에게 제대로 예의를 표시하지 않아서 미움을 사 관할 경찰서를 옮기게 되었고, 면책 특권을 이용해 불법주차를 하는 유엔 본부 사람들을 경사가 건드리지 못하게 하자 그 유리창을 박살냈다가 좌천되었다. 사회의 법은 그에게 그런 것이었다. '아니야 여긴 공정한 사회야'라고는 절대 말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난 책을 읽으면서 은근히 카타르시스를 느꼈던 것이다.
뭐, 조폭들도 자신은 이 동네의 평화를 지켜준다고 생각 할 것이다. 나(우리)같은 소시민인 이런 사건에 연류될 것도 없고 112에 신고할 일도 별로 없으니 사실 그렇게 가까운 얘기처럼 들리진 않는다. 그러나 이 허구의 세계를 읽으며 내가 싱숭싱싱숭 해진 것은 지금이 새벽 3시라는 것과, 이 사회에서 정의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읽는즐거움'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스티브 맥커리 展 - 진실의 순간 (0) | 2010.05.31 |
|---|---|
| [독서메모] 루츠 판 다이크 - 처음 읽는 아프리카의 역사 060331 (1) | 2010.04.02 |
| 김영환 - 미디어 삼국지 (1) | 2010.03.29 |